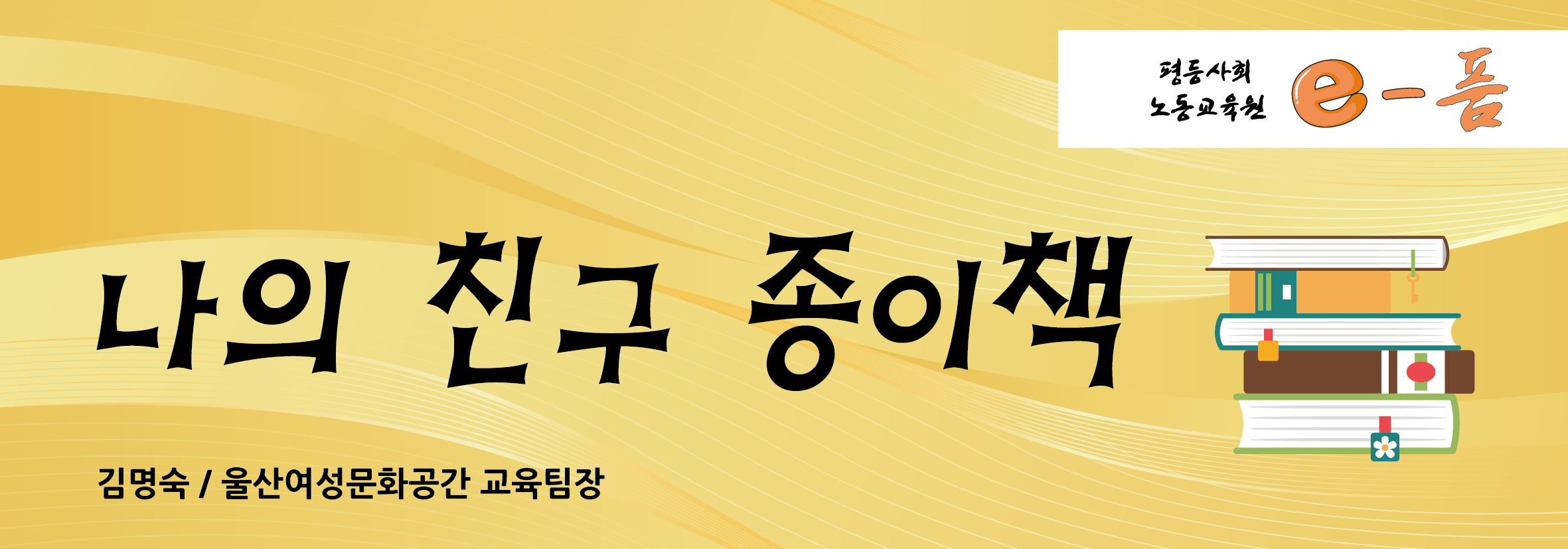
| 이번 호부터 김명숙 선생님의 책 추천 코너 <나의 친구 종이책>의 연재가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
김영하의 "단 한 번의 삶"
김명숙
울산여성문화공간 교육팀장,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울산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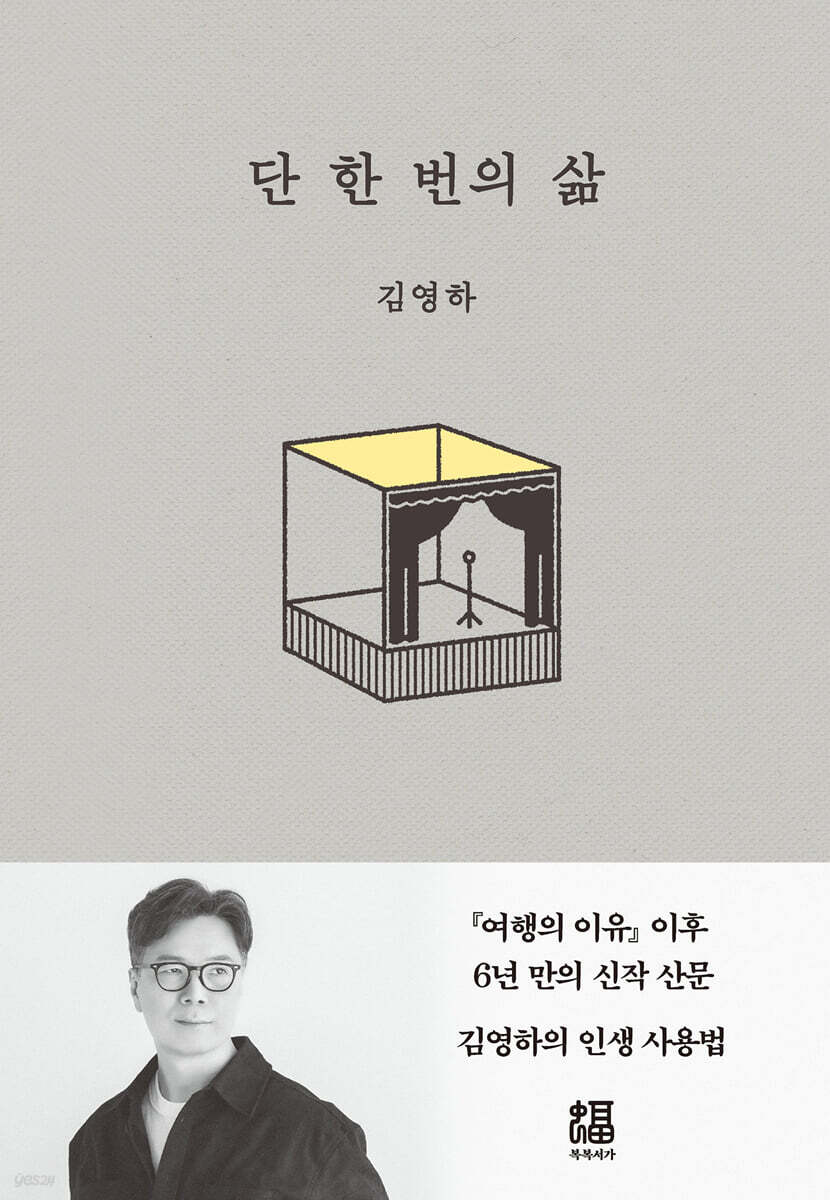
올 4월 출간되자 바로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차지한 책, 6월에 빌려보니 벌써 3쇄를 찍었다. 책 제목을 참 잘 정했다고 생각하며 읽기 시작했다. 나의 단 한 번의 삶을 생각하며 저자의 단 한 번의 삶 속으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풍덩 빠졌다. 대단한 필력이다. 김영하 저자의 책을 읽을 때 늘 느낀다.
“인생은 일회용으로 주어진다. 그처럼 귀중한 것이 단 하나만 주어진다는 사실에서 오는 불쾌는 쉽게 처리하기 어렵다.”는 문장으로 이 책은 시작된다. “일회용”, “불쾌”라는 단어의 선택이 신선하다. 일회용이라는 밀은 한 번 쓰고 버리는 편리하지만 환경에 유해한 것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 인생과 접속을 하니 새롭다. 인생은 좀 길지만 일회용이라는 것에 현재의 나는 동의한다. 불쾌라는 단어도 흔히 보는 ‘불안’이나 ‘고통’보다 더 싱싱한 느낌이다. 시작부터 유명 작가의 위세를 떨치는 듯 훅 치고 들어온다.
김영하 작가는 천천히 읽어야 하는 한강 작가 글과 달리 빠른 호흡으로 잘 읽히는 글을 쓴다.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서 깨달은 바를 통해 ‘단 한 번의 삶’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풀어나간다. 저자의 엄마, 아버지 그리고 자신 이야기가 중심이다.
저자는 후기에 고백한다. “원래 나는 ‘인생 사용법’이라는 호기로운 제목으로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내가 인생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할 말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략) 많은 이들이 이 단 한 번의 삶을 무시무시할 정도로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적기로 했다”고.
과거의 직업을 아들에게 평생 숨긴, ‘야로’를 좋아한 엄마, 평생 불화했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돌아보며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쓰고 있다. 생각해보니 나도 그럴 것이다. 아주 작은 부분만 알고 있을 것이다. 가족, 우린 서로 잘 모른다. 이에 대해 저자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기대와 실망이 뱅글뱅글 돌며 함께 추는 왈츠와 닮았다. 기대가 한 발 앞으로 나오면 실망이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실망이 오른쪽으로 돌면 기대도 함께 돈다.”고 말한다. 힘든 관계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이다.
부모는 자식의 저자라 표현하며 저자가 자신의 인물(자식)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한다. 나아가 작가들도 실제 자신의 작품의 인물들을 잘 모르게 되고 독자들이 더 잘 아는 경우가 많다고 유명 작가의 예를 들어 말한다. 그리고 자신도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세상에는 나를 대신해서 나를 보아주는 사람들이 있다. 천개의 강에 비치는 천 개의 달처럼, 나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타인의 마음에 비친 감각들의 총합이었고, 스스로에 대해 안다고 믿었던 많은 것들은 말 그대로 믿음에 불과했다.”고 고백한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망각하고 사는지 생각해본다. 난 이제 나를 믿을 수 없다. 무지의 자각과 더불어 퇴화되어 가는 기억력으로 틈틈이 불안하다. 숭산스님이 ‘오직 모를 뿐!’을 평생 외쳤던 이유가 떠오른다. 너무 자주 망각하니 독서로, 명상으로 깨어있으려 노력한다. 나의 어리석음을 늘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종종 나는 영화 “메멘토모리”의 주인공이 된다.
재미있게 구성되고 쉬운 언어에 간결한 문체로 쓰여진 책, 후루룩 잘 읽히지만 생각할 것은 많은 책이다. 저자가 인생에 대해 지금까지 깨달은 바의 핵심를 담은 책이다. 그래서 작가는 후기에 이렇게 말한다.
“다른 작가의 책을 읽다 보면 때로 어떤 예감을 받을 때가 있다. 아, 이건 이 작가가 평생 단 한 번만 쓸 수 있는 글이로구나. 내겐 이 책이 그런 것 같다.”
우린 모두 불평등한 세상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던져졌고 평등하게 ‘단 한 번의 삶’을 살고 있다. ‘단 한 번’의 무게에 짓눌려 고뇌하며 허둥대며 살아간다. 저자는 ‘어떤 위안’이라는 마지막 편에서 두서없이 살아온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노출한다. 그 파란만장한 불안한 삶을 살면서 여러 고통을 건너 찾은 위안을 우리에게 전한다.
“우리가 살지 않은 삶에 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미래에 나쁜 결과와 마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다.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갈망은 그 어떤 전략적 고려보다 우선하고, 살지 않은 삶에 대한 고찰은 그런 의미를 만들어내거나 찾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내 삶이 어쩌면 가능했을지도 모를 무한한 삶들 중 하나일 뿐이라면, 이 삶의 값은 0이며(1/∞=0) 아무 무게도 지니지 않을 것이니, 존재의 이 한없는 가벼움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더는 단 한 번의 삶이 두렵지 않을 것 같다. 태어나지 않았을 때 나는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것을 몰랐기에 전혀 애통하지 않았다. 죽음 이후에도 내가 죽었음을 모를 것이고, 저 우주의 다른 시공간 어디엔가는 내가 존재했는지도 모르는 내가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위안이다.”
'나의 친구 종이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나의 친구 종이책] 나를 알기 위해서 쓴다 (0) | 2026.01.16 |
|---|---|
| [나의 친구 종이책]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1) | 2025.12.10 |
| [나의 친구 종이책]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 (1) | 2025.11.11 |




